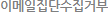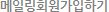삼조 승찬이 머물렀던 천주산에서 버스를 타고 1백여 리를 달리니 사조 도신이 불법을 폈던 사조정각선사(四祖正覺禪寺)가 보인다. 현지에서는 사조사라고 부르는데, 절 뒤쪽으로 펼쳐진 쌍봉산의 풍광이 가관이다. 중국인들이 얘기하듯 장강이 쌍봉산의 황금허리띠처럼 두르고 있고, 산자락 대숲에는 운무가 낀 날이 많다.
장강이 황금허리띠처럼 흐르고
수당시대를 살았던 도신(580-651)이 천주산 삼조사의 승찬 곁을 떠나 황매(黃梅) 쌍봉산에 절터를 잡았던 인연은 무엇일까. 분명한 필연이 있을 터인데 과문해서 그런지 아직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했다. 도신은 왜 황매 쌍봉산에 절터를 잡고 불법을 폈을까. 그 인연이 몹시 궁금하여 견딜 수 없다.
도신의 속성은 사마(司馬)씨이고, 원적은 하내(河內, 지금의 하남 심양현)지만 태어나기는 기주(蘄州) 영녕현(永寧縣, 지금의 호북 무혈시)라고 한다. 선대는 대대로 하내에 살았지만 부모 대에 기주로 이사한 것이다. 도신은 현령을 지낸 아버지와 학자 집안의 어머니 사이에 늦둥이로 태어나 자라면서 ‘신동’으로 불렸다고 전해진다. 도신 역시도 당시 학동들처럼 과거시험을 위한 유서(儒書)를 공부했으리라.
그런데 도신은 12살 때 글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백발의 노인으로 변신한 승찬을 만나 “장차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환공산(천주산)으로 가 두 스님을 만나도록 하라.”는 얘기를 듣고 결국 14살 때 환공산으로 들어가 승찬을 만나 9년 정진 끝에 의발을 전수받게 된다.
승찬 문하에서 9년 정진끝 전법
도신이 사람들 사이에 유명해진 것은 그가 수나라 인수(仁壽) 3년(603) 길주(吉州, 지금의 강서 길안시)로 가서 불법을 펴려고 하던 무렵, 도적의 무리를 제압한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길주에는 악질 토호들과 결탁한 도적들이 들끓고 있었다. 도적들은 길주성을 봉쇄한 후 관리들을 협박하여 돈과 식량을 요구했다. 관리들은 협상을 벌이는 한편 성 밖으로 사람을 내보내 다른 성의 관군을 요청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도적들이 경계를 삼엄하게 하고 있어서였다.
성이 도적떼들에게 포위된 지 두 달이 지나자 성안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 그때 길주로 온 도신이 성 안으로 잠입하여 고통 받는 백성들을 불법으로 위로했다. 소식을 들은 자사(刺史)가 도신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도적떼들이 언제쯤이면 물러 갈 것 같소.”
“백성들에게 마하반야(摩하般若)를 외게 한다면 저절로 물러갈 것이오.”
자사는 즉시 도신에게 가사를 입도록 하고 장수들을 불러 백성들과 함께 마하반야를 외게 하였다. 그때부터 성은 염불소리가 나는 거대한 법당으로 바뀌었다. 크게 놀란 도적의 괴수가 물었다.
“성 안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는 무엇인가. 도대체 마하반야가 무엇이기에 성 안 사람들이 밤낮으로 중얼거리는 것인지 알아오너라.”
“승려들이 외우는 주문이옵니다.”
“저 괴상망측한 소리가 들려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필시 무슨 까닭이 있을 터인즉 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성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괴수는 마하반야를 외는 소리가 멎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지만 포기하고 말았다. 도적떼들이 신병(神兵)이 나타난 줄 알고 동요하거나 더러는 도망치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괴수는 약탈을 포기하고 물러갔다.
도신의 법력은 곧 중국 전역으로 퍼져갔다. 얼마 후 도신은 형악(衡岳)의 조산(朝山)으로 길을 떠났는데, 도중에 강주(江州, 지금의 강서 구강시)에서 함께 공부했던 도반의 요청으로 여산(廬山) 대림사(大林寺)에 9년 동안 머물면서 설법했다. 이때 도신이 가르쳤던 경전은 <능가경>과 <문수설반야경(文殊說般若經)>이었는데, <문수설반야경>의 일행삼매(一行三昧)가 법문의 주제였다고 전해진다.
일행삼매에 들면 모든 것이 보리
‘눈 밝고 귀 있는 자여, 들으라. 어떻게 하면 일행삼매에 들 수 있는가.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부처만을 생각하라. 부처의 명호를 한결같이 외우라. 몸을 바르게 하고 부처에게로 염념상속(念念相續)한다면, 한 생각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다 볼 수가 있을 것이니라. 그것을 견불(見佛)이라고 하느니라.
견불이 곧 일행삼매인 것이니라. 자기와 부처가 하나 되니 삼매왕삼매(三昧王三昧)라고도 하느니라. 일행삼매에 들면 부처와 자기와의 구별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보리(菩提)가 되느니라.’
대림사에서 9년을 머문 도신은 다시 길을 떠났다.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기주 땅의 스님들 요청으로 영녕현 매주촌(梅州村, 지금의 무혈시) 매천진(梅川鎭)으로 갔다. 그러나 매주촌은 산이 낮고 사람들로 번잡하여 절터로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동쪽으로 옮겨갔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쌍봉산이었다. 도신은 쌍봉산의 풍광에 반하여 감탄을 금치 못했다.
도신은 며칠 동안 금식하며 좌선한 채 불경을 외우고 목어를 두드렸다. 목어를 두드리는 소리에 한 노인이 다가와 물었다.
“스님, 왜 여기에 앉아 불경을 외우는 것입니까.”
도신이 대답했다.
“가사 한 벌을 놓을 만한 땅에 절을 짓고 싶습니다.”
노인은 ‘가사 한 벌 놓을 만한 땅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흔쾌히 도신의 청을 들어주었다.
“좋습니다. 제가 시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신이 던진 가사는 놀랍게도 사방 십리가 조금 못되는 산자락을 덮었다. 마침내 도신은 쌍봉산 산자락에 절을 짓고 농토를 개간하며 불법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비로소 선종의 문이 활짝 열리어 수행대중이 1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쌍봉산 기운이 얼마나 상서로웠으면 도신이 며칠 동안 금식하며 밤낮으로 불경을 외우고 목어를 두드렸을까. 쌍봉산 연봉에 자줏빛 구름이 일산처럼 드리운 것을 일찍이 여산(廬山) 꼭대기에서 보았다는 도신이고 보면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 짐작된다. 당나라 시인 장호(張祜)도 <쌍봉사에서 놀다(遊雙峰寺)>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사조사가 쌍봉사라 불리었던 것 같다.

물 같은 달빛이 산 위 절에 걸려 있구나
눈 들어 보니 별들도 나를 따라 오는 듯하네
깊은 밤 회랑에는 사람의 말소리 끊기고
솔바람 소리만 나니 아마 학이 날아온 연유이리라.
月明如水山頭寺
仰面看天石也行
夜靜深廊人語定
一枝松動鶴來聲
도신의 법문에 걸음을 떼지 못하다
그러나 나는 산문을 들어서 벽에 양각으로 새겨진 도신의 법문에 걸음을 떼지 못하고 만다. 관광객의 발길로 어수선해진 사조사지만 감상이나 낭만 따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곳이 도량이다. 나는 당나라 시인 장호처럼 쌍봉산에 유람을 온 것이 아니라 조사들의 가르침을 좇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백천 가지 법문도 한 가지 마음으로 돌아가고
항하사만큼의 공덕도 모두 마음자리에 있다네.
百千法門 同歸方寸
河沙功德 總在心源
도신대사가 나융(懶融)선사에게 한 법문이라지만 사조사를 찾아온 나에게 설하는 것도 같아 마음이 서늘해진다. 방촌(方寸)이란 사방일촌의 크기인 심장을 뜻하는바 마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닐 것인가. 마음자리만 깨달으면 그 안에 백천 가지의 법문이 다 있고, 항하사만큼의 공덕이 모두 있는데 밖에서 무엇을 더 찾으려고 하는가. 내 마음 속에 이미 다 갖추어 있는데도 불법을 찾아 헤매고 있으니 나는 아직도 어리석은 중생이 분명하다.<계속>
정찬주(소설가)
*편집자 주; 소설가 정찬주 님이 연재하는 '내 인생을 바꾼 중국 선기행은 '위클리조선'에 10회까지 연재되었던 연재기획입니다. 11회부터는 불자독자들을 위해 미디어붓다에서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독자님들의 성원과 관심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