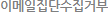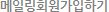아왕켄뽀의 보성론 강의(028)//
강의 : 켄뽀 아왕상뽀
(북인도 둑 다르마까라 승가대학 교수사/ 서울 성북구 캄따시링 센터장)
번역 및 정리 : 자홍스님 (캄따시링 법회 통역)
교정 : 캄따시링 역경원(지성남, 김지아)

아상가 논사의 탱화
내용을 정리해보자. 우리의 심상속(心相屬)에는 종성(種性, Tib. rigs)이 내재한다. 종성에는 자성주종성(自性住種性, Tib. rang bzhin gnas rigs, Skt. svabhāvasthānagotra)과 수증종성(隨增種性, Tib. rgyas 'gyur gyi rigs)이 있다. 자성주종성은 무시이래 우리에게 존재하는 법성(法性)이다. 자성주종성에 의해 우리는 자비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선심(善心)을 일으킨다. 이러한 마음을 수증종성이라고 한다. 자성주종성이 있으므로, 그것에 의지하여 우리는 법신(法身) 혹은 자성신(自性身, Tib. ngo bo nyid sku, Skt. svabhāva-kāya)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러한 성취를 위해서는 종성을 깨달아야만 한다.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방편에 의지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과 지혜 중에서, 어떤 이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지혜가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현대에는 영리한 사람은 많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믿음이 있다면 그다음으로는 올바른 견해가 필요하다.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올바르게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거함과 둠, 즉 버림과 취함의 양자를 모두 떠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학생 : 버릴 바도 없고 취할 바도 없다면, 왜 선업을 짓고 복덕을 쌓아야 합니까?
켄뽀 : 그럼에도 악한 행위는 버려야 하고, 선한 행위는 취해야 한다. 여러분은 견해와 행위를 구별해야 한다. 견해를 닦을 때는, 취사(取捨)·긍정과 부정을 떠난다. 그렇지 않으면 실상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행위에 있어서는 취하고 버림이 명확해야 한다. 견해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서, 행위가 그쪽으로 모두 매몰되어 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들은 선악도 없고, 인과도 없어서 모든 것이 텅 빈 허공과 같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행위 쪽으로 기울어서 견해가 그쪽으로 매몰되면, 상(相, Tib. mtshan ma)에 대한 집착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심자성(心自性)을 보라고 할 때와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할 때는 명백히 다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견해는 취사(取捨)를 떠난 승의제(勝義諦)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고, 행위는 세속제(世俗諦)의 양상으로 유정(有情)의 지혜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것이기에, 취하고 버림과 행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행위자, 행위, 행위 대상의 공함이라는 삼륜청정(三輪淸淨)을 인지한 채로 보시를 행해야 하는 것처럼, 견해에 근거하여 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의 이야기는 아니다.
구별을 수반하는 속성을 지닌
객진(客塵)이, 계(界)는 공하다.
그러나 구별이 없는 속성을 지닌
무상(無上)의 법(法)은 공하지 않다. [1.155]
།རྣམ་དབྱེ་བཅས་པའི་མཚན་ཉིད་ཅན། །གློ་བུར་དག་གིས་ཁམས་སྟོང་གི།
།རྣམ་དབྱེ་མེད་པའི་མཚན་ཉིད་ཅན། །བླ་མེད་ཆོས་ཀྱིས་སྟོང་མ་ཡིན།
1.155에서는 실상 혹은 승의(勝義)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한다. "구별을 수반하는 속성을 지닌 객진(客塵)이, 계(界)는 공하다."라고 하였다. 객진(客塵)은 '구별을 수반하는 속성'을 지닌 세속(世俗)이다. '구별을 수반(Tib. rna dbye bcas pa, Skt. sa-vinirbhāga)'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고 분별된다는 의미이다.
학생 : 여래장이 '구별을 수반하는 속성'이 공하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켄뽀 : 지금 이 내용은 타공(他空)에 대해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관용구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구별을 수반하다는 것은, 분별로써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고 구분된다는 의미이고, 또한 언어로써 이것과 저것으로 규정되는 바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구별이 가능한 것은 모두 객진(客塵)의 법에 속한다. 여기서 공(空)함의 토대(Tib. stong gzhi)는 여래장·계이므로, 여래장·계(界)에 있어서 세속·객진의 법은 공(空)하다. 즉 여래장·계에 있어서 이러한 구별되는 법들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별이 없는 속성을 지닌 무상(無上)의 법(法)은 공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계(界)는 분별과 언어로써 구별되는 바인 객진의 세속은 공하다. 그러나 여래장에 있어서, 분별과 언어로써 구별되는 바가 아닌 무상(無上)의 법은 공하지 않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래장은 텅 빈 공(空)이 아니며, 무(無)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여래장에 대해 상(常), 락(樂), 아(我), 정(淨)이라고 하였다.
잠곤꽁뚤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제거와 두기(取捨)에서 벗어난 마음의 자성은 극단(邊)을 떠난 것이다. 그 계(界)와 구별되니, 분리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객진의 염오가 그 계(界)는 공하므로 증익(增益, Tib. sgro 'dogs, Skt. samāropa)에서 벗어났다. 그 계와 구별하여 분리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위없는 덕의 법력(法力) 등이 그 계는 공하지 않으므로, 무(無)라는 손감(損減, Tib. skur 'debs, Skt. apavāda)의 변(邊)에서도 벗어났다. 상호모순이므로 유(有)이면서 무(無)라는 2중의 변(邊)으로부터도 벗어나며, 그러면서 그것[유이면서 무임]을 부정하는 2가지도 아니므로, 두 가지가 모두 아니라는 변으로부터도 벗어난다. 그러므로 2가지 변 혹은 4가지 변에서 자유로운, 전도됨 없는 공성의 올바른 양상이 바로 진여이다."
학생 : 티베트어 원문에서 chos kyis stong ma yin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kyis는 도구격(instrumental)으로 보통, '~로써', '~에 의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법으로써 공(空)하다.'라고 하면 한국어로는 의미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켄뽀 : '~로써'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가'나 '~이'와 같은 주격 조사로 번역하는 게 더 나을 듯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이 다른 어떤 사물의 위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온은 아(我)가 공하다.'라고 하면, 오온이라는 바탕 위에 아(我)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학생 : 좀 더 쉬운 예를 들어주십시오.
켄뽀 : 티베트어로 bum pas stong pa'i cog tse라고 한다면, '병(甁)이 공한 책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무슨 의미인가? 책상 위에 병이 없다는 뜻이다. 즉, 책상에 병이 공(空)하다는 말이 된다. 여기서 bum pas라는 말을 'bum pa(甁)에 의해' 혹은 'bum pa로 인하여'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난해할 수 있다. 티베트어로는 명확한 표현이지만 한국어로는 불명료해질 수 있다.
여기서 자공(自空, Tib. rang stong)과 타공(他空, Tib. gzhan stong)에 대해 좀 더 설명하겠다. 자공설은 일체법이 모두 공하므로 그 어떤 것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성립하는 법은 그 어떠한 것도 없다. 반면에 타공설에서는, 세세속의 법은 모두 공하지만, 승의(勝義)·여래장은 공하지 않다고 한다. 여래장에는 어떠한 세속법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모든 세속법이 공하다. 그렇지만 여래장 자체에 있어서 여래장 그 자체는 공하지 않다. 여래장은 상주(常住)하는 것이며, 실유(實有)이다. 이러한 타공설의 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전거가 바로 보성론의 1.155의 구절이다.
학생 : 타공설은 유식(唯識)은 유사합니까?
켄뽀 : 일견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티베트 불교 교학에서 타공설은 엄연히 유식과는 다르게 분류된다. 다만 타공설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타공설은 중관이 아니라 유식사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비판은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구름, 꿈, 환영처럼, 여기저기에서
일체의 소지(所知)는 모든 측면에서 공하다고
설하신 다음에, 여기서 승리자들은 유정들에게
불성(佛性)이 있다고 어째서 말씀하셨는가? [1.156]
།སྤྲིན་དང་རྨི་ལམ་སྒྱུ་བཞིན་དེ་དང་དེར། །ཤེས་བྱ་ཐམས་ཅད་རྣམ་ཀུན་སྟོང་པ་ཞེས།
།གསུངས་ནས་ཡང་འདིར་རྒྱལ་རྣམས་སེམས་ཅན་ལ། །སངས་རྒྱས་སྙིང་པོ་ཡོད་ཅེས་ཅི་སྟེ་གསུངས།
"구름, 꿈, 환영처럼, 여기저기에서 일체의 소지(所知)는 모든 측면에서 공하다고 설하신 다음에,"라고 하였다. 모든 소지(所知)의 법은 허공의 구름과 같으며, 꿈과 같으며, 환영과 같다. 현현(顯現)할 뿐 진실로 성립하는 것은 없다. 모두 공할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처음에는 4제(四諦)의 법륜을 설하셨고, 그다음에 제2법륜인 무상(無相)의 반야바라밀다의 법륜에서 제법이 공함을 설하셨다.
"여기서 승리자들은 유정들에게 불성(佛性)이 있다고 어째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였는데, '승리자'는 부처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제3법륜인 여래장(如來藏)의 법륜에서는 어째서, 유정들에게 불성(佛性)이 실유(實有)하고 공성(空性)이 아니라고 설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157부터 이어진다.
마음이 겁약함, 하위 유정에 대한 경멸,
실상이 아닌 것에 대한 집착, 실상인 법에 대한 폄하,
자아에 대한 과도한 애착의 허물. 다섯 가지가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 설하였다. [1.157]
།སེམས་ཞུམ་སེམས་ཅན་དམན་ལ་བརྙས་པ་དང་། །ཡང་དག་མིན་འཛིན་ཡང་དག་ཆོས་ལ་སྐུར།
།བདག་ཅག་ལྷག་པའི་སྐྱོན་ལྔ་གང་དག་ལ། །ཡོད་པ་དེ་དག་དེ་སྤང་དོན་དུ་གསུངས།
"마음이 겁약함, 하위 유정에 대한 경멸, 실상이 아닌 것에 대한 집착, 실상인 법에 대한 폄하, 자아에 대한 과도한 애착의 허물. 다섯 가지가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 설하였다."이라고 하였다. ①마음이 겁약함 ②하위 유정에 대한 경멸 ③실상이 아닌 것에 대한 집착 ④실상법(實相法)에 대한 폄하 ⑤자아에 대한 과도한 애착-이라는 다섯 가지의 허물 전부나 그중의 어떤 것을 지닌 이에게, 그들이 그 허물을 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래장 교설이 설해진 것이다.
실제(實際)는 유위법이
일체(一切)의 측면에서 없으니
번뇌, 업 그리고 이숙(異熟)의 의미는
구름 등과 같다고 말한다. [1.158]
།ཡང་དག་མཐའ་ནི་འདུས་བྱས་ཀྱིས། །རྣམ་པ་ཐམས་ཅད་དབེན་པ་སྟེ།
།ཉོན་མོངས་ལས་དང་རྣམ་སྨིན་དོན། །སྤྲིན་ལ་སོགས་པ་བཞིན་དུ་བརྗོད།
"실제(實際)는 유위법이 일체(一切)의 측면에서 없으니"라고 하였다. 실제(實際, Tib. yang dag mtha', Skt. bhūtakoṭi)라고도 하고 승의(勝義)라고도 하며, 여래장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심자성(心自性)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체(一切)의 측면에서"라고 한 것은, 모든 경우에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모든 유위법이 일체(一切)의 측면에서 없다.'라고 한 것은, 여래장은 유위법이 공하다는 뜻이다.
"번뇌, 업 그리고 이숙(異熟)의 의미는 구름 등과 같다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이숙(異熟, Tib. rnam smin, Skt. vipāka)은 번뇌와 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고(苦)의 온(蘊)을 가리킨다. '구름 등'이라고 한 것은, 앞의 1.156의 1행에서 언급했던 구름, 꿈, 환영을 말한다. 이러한 세속법은 모두 구름과 같고 꿈과 환영과 같다. 실제로는 실유하지 않지만, 마치 실유하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轉倒)되고 착란된다.
잠곤꽁뚤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중시교(中侍敎, Tib. bka' bar pa)에서 일체법이 무자성(無自性)이라고 설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실제(實際)의 자성(自性)에는, 유위•객진(客塵)의 염오가 모든 측면에서 없음을 뜻하신 것이다. 번뇌의 괴로움, 업의 괴로움, 업과 번뇌의 이숙(異熟)인 온(蘊) 등 실제로 나타나는 괴로움은 실유(實有)하지 않으니, '구름 등'으로써 꿈, 환영, 환화(幻化)와 같다고 설하였다."
번뇌는 구름과 같으며
업은 꿈 속에서 향유함과 같다.
번뇌와 업의 이숙(異熟)인
온(蘊)은 환화(幻化)이다. [1.159]
།ཉོན་མོངས་སྤྲིན་འདྲ་བྱ་བ་ཡིན། །ལས་ནི་རྨི་ལམ་ལོངས་སྤྱོད་བཞིན།
།ཉོན་མོངས་ལས་ཀྱི་རྣམ་པར་སྨིན། །ཕུང་པོ་སྒྱུ་མ་སྤྲུལ་པ་བཞིན།
"번뇌는 구름과 같으며"라고 하였다. 실제(實際)•승의(勝義)에 있어서, 모든 유위법은 실유(實有)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위법이 실유처럼 나타난다. 어째서인가? 번뇌가 하늘을 가리는 구름처럼 장애하기 때문이다. 하늘에 태양이 빛나고 있더라도 구름이 가리면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번뇌가 있으면 그것이 장애하여 실제(實際)가 보이지 않는다.
"업은 꿈 속의 경험과 같다."라고 하였다. 유위법들이 모두 실유가 아니라면, 그것을 향유하고 활용하고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음식을 먹고 볼거리를 구경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진다.
"번뇌와 업의 이숙(異熟)인 온(蘊)은 환화(幻化)이다."라고 하였다. '번뇌와 업의 이숙(異熟)인 온(蘊)'은 업과 번뇌에 의해 성립된 우리 심신(心身)의 온(蘊)을 가리킨다. 이것은 환화(幻化)와 같다. 마치 환영이 갖가지로 변화하여 나타나듯, 실유로는 성립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원인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환영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결코 무엇인가 실제로 성립된 것은 아니다. 실유가 아니면서 마치 실유인 것처럼 나타날 뿐이다.
학생 : 이숙(異熟)의 과(果)란 무슨 뜻입니까?
켄뽀 : 5과(五果, Tib. 'bras bu lnga)란, ①등류과(等流果, Tib. rgyu mthun gyi 'bras bu, Skt. niṣyanda-phala) ②증상과(增上果, Tib. bdag po'i 'bras bu, Skt. adhipati-phala) ③이숙과(異熟果, Tib. rnam par smin pa'i 'bras bu, Skt. vipāka-phala) ④사용과(士用果, Tib. skyes bu'i byed pa'i 'bras bu, Skt. puruṣa-kāra-phala) ⑤이계과(離系果, Tib. bral ba'i 'bras bu, Skt. visaṁyoga-phala)이다. 이 중에서 업과 번뇌에 의해서 생성되는 결과를 이숙과(異熟果, Tib. rnam smin gyi 'bras bu, Skt. vipāka-phala)라고 한다. 여기서 이숙과는 선악업에 의해 생겨나는 유루(有漏)의 온(蘊)이다.
이숙과(異熟果)에 관해서 잠곤미팜('jam mgon mi pham rgya mtsho, 1846-1912)은 『지자도입문(智者道入門)』(mkhas pa'i tshul la 'jug pa'i sgo)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5과(五果)의 첫 번째인 이숙과(異熟果)는 유루(有漏)인 윤회(輪廻)의 고락(苦樂)의 경험이 발생하는 토대가 되는 과(果)의 측면들이다. 그 자체의 본질은 무부무기(無覆無記)이고, 자기의 상속(相續)으로 선, 불선 중의 어떤 것으로 선언된 이숙인(異熟因)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유정(有情)의 상속(相續)으로 포함되거나, 그것과 관련된 법으로 분류된다." (BDRC bdr:MW1KG3364, vol1, img. 28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