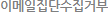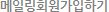(도판01 <인드라살라 동굴에서 삼매에 든 붓다> 위의 좌측) (도판02 <빔비사라왕의 행차> 위의 우측. 영축산에 계신 붓다를 만나러 가는 빔비사라왕의 모습) (도판03 <영축산 정상 향실香室 터, 붓다 설법하신 자리> 하단)
“아아 괴롭다! 괴로워 미치겠다!” 붓다는 밤에 나와 거닐다가 이렇게 “괴롭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명하신다. “그대는 오라! 여기는 안온한 곳이다. 열반은 지극히 맑고 시원하다. 적멸은 모든 번뇌를 떠나 있다.”
-『붓다차리타』
붓다, 첫 포교의 불을 밝히다
“그대는 오라!”라는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한 사람은 야사(Yaśas)이다. 그는 바라나시의 큰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 마침 세상을 염오하는 마음이 가득했기에 붓다의 부름을 듣자마자 마음이 활짝 열려 바로 출가하게 된다. 야사의 친구들 54명이 그를 따라 모두 출가한 것으로 보아 붓다는 꽤 큰 무리를 제자로 거느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들에게 고통 속의 중생을 제도할 것을 당부하신다. 전격적인 포교의 시작이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중생의 이익을 위해, 중생의 행복을 위해, 세상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 아직 제도되지 못한 이들을 제도하라. 중생의 고통은 타고 있는데 오랫동안 아무도 구호할 사람 없네.” 그 때 60명의 비구들은 그 교지를 받들어 법을 널리 펴려고, 각기 그 과거 인연을 쫓아 사방으로 흩어졌네.
불火을 숭배하는 외도를 굴복시키다
붓다의 초기 교화 중에 손꼽히는 업적으로, 불을 숭배하는 교단을 굴복시켜 그들을 모두 포섭한 행적이 있다. 깟사빠 삼형제는 불의 신(Agni)를 섬기며 약 1천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우루웰라 숲 속에 거주하며 거대한 교단(자띨라Jatila, 結髮外道)을 이루고 있었다. 붓다는 그들의 수행처로 찾아가서, 사나운 독룡이 있는 사당에서 하룻밤 머물기를 자청하신다. 모두 붓다가 독룡에게 죽임을 당했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붓다는 신통력으로 독룡을 제압한다. 이에 깟사빠는 “복을 닦으려고 불의 신을 섬겼으나, 그 과보는 모두 생사에 바퀴 돌고 번뇌만 더했나니,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버리네”라며 “생을 받음은 괴로움의 근본”임을 터득하고 붓다의 보다 수승한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나는 고행하고, 제사를 올리고, 큰 모임을 여는 것이 가장 제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는 바른 도에 더욱 멀어지는 행위였네. 이에 보다 훌륭한 적멸을 구하니, 그것은 생로병사 완전히 떠나 다함없는 밝고 시원한 경계이니, 나는 이 이치를 알았으므로, 불을 숭배하는 것을 버렸느니라.”
진정 불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불타오름경』
붓다는 자신에게 귀의한 이들 배화교도 1천 명을 이끌고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Rajagrha 왕사성)으로 가던 도중, 가야시사(코끼리 모양의 바위가 있기에 상두산象頭山이라고도 함)에서 ‘불의 설법’을 하시게 된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불타오름경』(또는 연소경燃燒經, Áditta-sutta, S35:28)이다. 아침저녁으로 오로지 불만 섬기던 이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붓다는 ‘12처가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비유로 들어 법을 설하신다. “온 세상이 불타오른다”고 하시자 깟사빠는 “무슨 뜻입니까?”라고 묻는다.
“눈이 불타오르고 있다. 형색이 불타오르고 있다. 안식眼識이 불타고 있다. 안촉眼觸이 불타오르고 있다. 안촉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느낌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의 불로 타고, 성냄의 불로 타고, 어리석음의 불고 타오르고 있다.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근심,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귀, 코, 혀, 몸, 마노(意根)도 모두 마찬가지로 불타오르고 있다.”
- 『불타오름경』
존재가 불타오른다. 우리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라며 움켜쥐고 있는 ‘나와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12처의 환영 덩어리(오온) 일뿐이다. 그리고 이 불타오르는 12처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형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안식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안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안촉에서 발생하는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하라.(귀, 코, 혀, 몸, 마노도 마찬가지)”라고 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의 눈·귀·코·입·마음의 작용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즐겨 행하던 반응의 패턴과 더욱 자극적인 감각의 추구가, 바로 나를 불타게 하는 것임을 알고, 고통의 씨앗인줄 알고 염오하라는 말씀이시다. 즉, 경계에 즉각 반응하여 빛의 속도로 ‘쫓아가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염오하면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빛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그 지혜로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꿰뚫어 안다.”
(도판04) 라자가하(왕사성) 유적지, 성벽의 잔해. 붓다 당시 6대 도시 중 하나로 교통의 요지였던 이곳은 현재는 그 터만 남아있다.
(도판05) <죽림정사>의 칼란다카 연못 풍경, 라자가하. 붓다가 처음으로 교단을 이루고 활동하신 곳. 붓다는 여기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열일곱 번째, 스무 번째 안거를 나셨고, 총 20년에 걸쳐서 이곳을 근거지로 교화를 펼쳤다.
최초의 大후원자 ‘빔비사라왕’과 <죽림정사>
붓다가 교단을 이루고 주석하시면서 활동한 곳으로 죽림정사와 기원정사가 유명하다. 라자가하에 위치한 죽림정사(竹林精舍, 웰루와나 Veluvana, Venuvana)는 붓다가 첫 교단을 이룬 곳으로 당시 마가다국의 왕 빔비사라가 기증한 곳이다. 빔비사라왕과 석가모니 붓다와의 인연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출가 후, 라자가하에서 탁발하는 고타마 싯타르타를 보고, 그 탁월한 용모와 수승한 기품에 한 눈에 반한 빔비사라왕은 싯타르타에게 군대와 재력과 지위를 제시한다. 하지만, 그러한 욕망을 쫓으려 출가한 것이 아니라며 단박에 거절하는 싯타르타. 이에 출가한 뜻을 이루면 그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빔비사라왕은 부탁한다. 6년 후, 붓다는 라자가하로 돌아와서 그 약속을 지키게 된다.
(도판06) 영취산의 붓다를 뵙기 위해 라자가하에서 출발하는 빔비사라왕의 행렬. 산치대탑 제1탑 동문, 왼쪽 기둥의 전면, 하단 패널의 부조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 그리고 인연법(연기법緣起法)
다시 만난 빔비사라왕에게 붓다가 설하신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 먼저 ‘평등관平等觀’으로 보아 몸과 마음의 근根(원인)을 보면, 그것이 생멸生滅함을 알게 되고 그 주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신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의 실체를 알게 되면,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고통의 덩어리임을, 그래서 괴로움에 살다가 괴로움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는 모두 ‘삿되게 만들어져서 받은 것’이라며 ‘무상, 고, 무아’라는 현상을 보라고 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운영되는 원리는 연기법임을 말하신다. 이에 빔비사라왕은 법안法眼이 생기게 된다. 법안이란, 법(현상)을 보는 지혜를 말한다.
만드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으며/ 주인 없어 항상 옮겨 가나니/ 태어남과 죽음은 밤낮으로 흘러가네/ (중략) 여섯 근根과 여섯 경계와/ 그것의 인연因緣으로 여섯 식六識이 생기네/ 이 세가지가 합하여 촉觸이 생겨/ 마음과 생각의 업이 따라 굴러가네.
-『붓다차리타』
최초의 승원, 죽림정사
“세존께서는 어떤 장소에 지내셔야 할까? 마을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오고가기에 편하며, 다양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찾아뵙기 좋고, 낮에는 너무 붐비지 않고, 밤에는 소음이 없고 인적이 드물고, 혼자 지내기에도 좋고, 좌선하기 적절한 곳, 바로 그런 곳에 머무셔야 하는데”라고 빔비사라왕은 고민한다. 그리고 웰루와나(죽림정사)가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하고 여기를 승원僧園으로 바치게 된다. 이에 붓다는 “나는 승원을 받기로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도판08) 죽림정사, 붓다의 설법을 듣기 위해 죽림정사를 방문한 빔비사라왕. 붓다는 보리수와 금강대좌로 표현되었다. 그 양쪽으로 큰 키의 대나무가 서있다. 빔비사라왕의 청으로 붓다가 죽림정사에 주석하게 되자, 사리불과 목련존자 등 큰 제자들이 출가하여 귀의하게 된다. 산치대탑 제1탑 북문, 왼쪽 기둥의 안쪽 면, 세 번째 패널의 부조.
신들의 제왕, 제석천의 질문 『제석천 질문경』
붓다가 처음으로 승원을 기증받아 교단을 형성하여 전법과 교화를 하신 곳, 라자가하. 이곳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유적지가 인드라살라 동굴(Indrasala Cave, 제석굴)과 영축산이겠다. 인드라살라 동굴은 라자가하의 동쪽에 있는 베디야 산에 있다. 이 동굴은 두 개의 언덕(우다야 언덕과 찻타 언덕) 사이에 있는데, 그 입구에는 인다쌀라(Indasala) 나무가 무성하였기에 인다쌀라 동굴로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는 ‘인드라살라 동굴’, 즉 제석굴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모든 신들의 제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드라(Indra 또는 싹카Sakka, 제석천)가, 이곳에서 자주 명상에 드시는 붓다를 찾아와, 질문을 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제석천 질문경(Sakkapanhasutta)』(디가니까야II.263, 장아함10 제석환인문경帝釋桓因問經, 중아함33 석문경釋問經,『신들과 인간의 스승-디가니까야 엔솔로지-』전재성 역주, p.424 참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주제는 초기 불교미술의 단골 내용으로 조성되곤 하였다.
(도판09) <인드라살라 동굴(제석굴)에서 명상에 든 붓다>. AD1세기, 편암, 파키스탄 페샤와르 박물관 소장.
(도판10)(도판11) 도판09의 부분. 건달바의 아들 빤짜시카가 서서 비파를 연주하고 그 옆에 제석천이 앉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도판10 촤측) 삼매에 든 붓다의 모습(도판11 우측)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들께서 세상에 출현하면, 신들의 무리는 증가하고 아수라의 무리는 줄어든다.”라고 제석천은 직접 듣고 파악했다.(『제석천 질문경』. 디가니까야)
‘제석천의 질문’과 관련된 <인드라살라 동굴의 붓다>의 조성은 일찍이 기원전 150년 경 마하보디 사원(보드가야) 출토 작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도판13) 그리고 산치대탑에도 빠지지 않는 주제이며(도판12), 이는 간다라 마투라 시대의 조형 테마로도 이어진다.(도판14, 도판09) 보드가야 및 산치대탑에 묘사된 작품에는, 붓다를 직접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빈 동굴과 금강대좌로만 표현하고 있다. 이를 무불상시대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붓다를 인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오히려 법신과 계합한 붓다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시기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이 주제(제석천의 질문)와 관련하여 가장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페르샤와 박물관 소장 간다라 시대 작품 <인드라살라 동굴(제석굴)에서 명상에 든 붓다>이다.(도판09) 시선을 아래고 향한 채 삼매에 든 부처의 모습은 정말 이 세상을 떠나 있는 듯, 고요하고 숭고하다. 동굴의 좌선 장소의 표현을 아치 형태로 내부에 공간을 만들어 연출했으며, 동굴 주변으로는 전생과 현생의 다양한 생멸生滅이 흘러가듯 표현했다. (정면에서 보아) 우측 하단에 코끼리가 있으며 그 좌측 하단으로 다양한 신들의 행렬이 보인다. 그리고 좌측 상단(도판10)에 제석천으로 추정되는 조상이 앉아 있다. 그 옆에는 손에 무언가 타원형의 긴 물건을 들고 서있는 형상의 존상이 있는데, 이는 건달바의 아들 빤짜씨카로 추정된다. 제석천과 함께 빤짜씨카가 등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판12 – 14) <제석천의 질문> 인드라살라 동굴(제석굴)의 붓다를 찾아간 신들의 제왕 제석천. (도판12: 산치대탑 제1탑 북문, 왼쪽 기둥의 안쪽 면, 가장 위 패널의 부조, 위의 좌측) (도판13: 최초의 <인드라의 질문> 조상으로 추정. 마하보디 사원(보드가야) 출토, BC 150, 위의 우측) (도판14: 편암 부조 패널, 간다라, 로리안 탕가이 출토, 인도박물관 소장, 하단 사진)
“원한과 폭력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래가 선정에 들어 선정을 즐기며 그것에 몰입하여 명상하실 때는, 나와 같은 자가 다가가기 어렵다. 그러니 네가 먼저 세존을 기쁘게 해 드리면 그 연후에, 내가 다가갈 것이다.”라고 제석천은 빤짜시카에게 비파를 먼저 연주해서 명상에 든 붓다에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음악의 신 건달바의 아들 빤차시카는 노란 대나무 비파를 켜고 붓다를 칭송하는 노랫소리로 붓다의 주의를 끄는 데 성공한다. 드디어 붓다가 제석천의 질문을 허락하자, 제석천이 한 질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존자여, 다양한 무리의 신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는 원한을 여의고 폭력을 여의고 적을 만들지 않고 분노 없이 증오 없이 지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에 결박되어 원한에 매이고, 폭력에 매이고, 적을 만들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지내는 것입니까.”
-『제석천 질문경』
제석천이 그토록 묻고 싶었던 것은 ‘원한과 폭력의 이유’였다. 이에 대해 붓다는 ‘질투와 인색’이 그 원인이라고 말씀하신다. 질투는 타인의 성공에 화를 내는 것이고, 인색은 자신의 성공을 남과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석천은 ‘질투와 인색’의 이유는 무엇이냐고 다시 묻는다. 이에 질투와 인색은 ‘좋아함과 싫어함’을 원인으로 생긴다고 하신다. 다시 제석천의 질문은 계속되고, 그 원인의 원인은 붓다의 대답으로 파헤쳐지게 된다. ‘좋아하고 싫어함’은 ‘욕망’을 조건으로 하고, 욕망은 ‘사유’(다듬어지지 않은 생각: 갈애에 의한 결정과 견해에 의한 결정, 2가지가 있다.)를 조건으로 하고, 사유는 ‘지각과 관념’을 조건으로 하고, 지각과 관념은 ‘희론(망상 또는 번뇌)’을 조건으로 생겨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소멸할 것인가에 대한 제석천의 질문에, 그 실천적 방법으로, 붓다는 선업이 되는 길과 불선업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수행자의 목적을 제시하게 된다.
영축산의 신비와 붓다의 설법
라자가하의 주변에는 다섯 개의 산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그 유명한 영축산(靈鷲山 또는 영취산, 기사굴산)이다. 왕사성에서 바라보면 약간 동쪽 끝으로 보이는 찻타 언덕의 남쪽 경사면에 위치한다.
(도판15) 독수리 머리 모양 바위, 영축산.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쉬고 있는 형상이기에 독수리봉(영축산)으로 불린다.
(도판16) 영축산 정상의 향실 터. 석가모니 붓다가 이곳에서 법화경 무량수경 등의 주요 대승 경전을 설하신 것으로 유명하다.
영축산에서 다양한 대승의 설법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법화경의 내용이다. 법화경의 요지는 보살승의 강조이다. 녹야원에서 하신 초전법륜의 내용인 4성제는 ‘성문을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였다’라는 내용이 경전 앞부분에 나온다. 요약하자면, “성문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4성제를 설해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건너서 해탈 열반에 이르게 하고, 벽지불(연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12인연법(무명∙ 행 ∙ 식 ∙ 명색 ∙ 육입 ∙ 촉 ∙ 수 ∙ 애 ∙ 취 ∙ 유 ∙ 생 ∙ 노사)을 설하시어 모든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인과를 밝히시고, 보살을 구하는 이에게는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지혜의 6바라밀을 설하셨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본 설법의 취지는 열반이 아니라 보살승이 궁극의 목표라는 것이고 이것이 일불승一佛乘 즉, 대승大乘이라는 것이다.
(도판17) 붓다가 가르침을 베푼 자리에는 신도들의 끊임없는 순례가 계속된다.
(도판18) 영축산 중턱의 석굴. 붓다가 참선과 휴식의 장소로 사용하셨던 곳. 빈자리에는 붓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시공을 초월한 붓다의 존재감이 아직도 생생하다.
<영산회상도> 영축산의 장엄이 불교미술로!
이곳 영축산의 설법을 ‘영산회상靈山會上’이라고 한다. 붓다가 영축산의 정상의 이 향실터에서 지상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커다란 광명을 놓으셨을 때, 큰 비구 1만 2천 명 · 보살 8만 명 · 제석천과 그의 무리 2만 명 · 사천왕과 그들의 각 권속 1만 명 · 팔부중과 그들의 각 권속 백 천 명 등의 무수한 대중들이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고 한다. 라자가하의 동북쪽 약 3 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이 산은 기사굴산(Grdhrakūta)이라 하는데, 신령스러운 독수리 머리 형상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그 뜻에 따라 의역하면 영취산靈鷲山 또는 영축산이 된다. 이 영취산을 줄여 영산靈山이라고 한다. 영산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승의 법을 즐겨 설법하시던 장소로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근기根機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자비의 설법인 『법화경』을 설한 곳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설법을 듣기위해 무수한 대중들이 모였기에 ‘영산회상’이라고 한다. ‘영산회상’의 장엄한 풍경은 불교미술의 전통 속에서 주요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법화경의 첫머리 변상도로(도판19), 또 조선시대 대웅전의 탱화로(도판21) 참으로 오랫동안 숭배되고 사랑받아 왔다.(이하 도판 및 도판 해설 참조)
(도판19)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감지금니 사경: 1340년 <묘법연화경> 7권본 (일본 니베시마보효회 소장)
(도판20) 도판19의 부분: “지금 부처님께서 미간 백호로 광명을 놓으사 동방 일만 팔천 국토를 비추시는 이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징조를 보니, 옛날 일월등명 부처님의 경우와 조금도 다를 바 없고 헤아려 보건대, 오늘 부처님께서도 ”인류를 구제”하고 사회를 제도하며 훌륭한 가르침인 대승경을 설하실 것이니 그 이름은 『묘법연화경』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염念하시는 경이라.“(「서품」『법화경』)
(도판21) <영산회상도> 해인사, 1729년, 비단에 채색, 240x229.5cm, 보물1273호
(도판22)(도판23) 구원성불久遠成佛의 개념: ”나는 한량없는 과거로부터 무한한 미래에까지/ 다양한 이름과 모습으로 출현하였는데/ 이는 모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만일 어떤 중생이 내게 찾아오면/ 나는 부처님의 눈으로/ 그의 믿음과 근기의 날카롭고 둔함을 보아/ 제도할 바를 따라 곳곳에서 설하되/ 이름도 다르며 수명도 달랐으며 또는 열반에 들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설해/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의 마음을 내게 했다.“(「여래수량품」『법화경』)
(도판24) 영축산의 오색 깃발. 세계 각국에서 온 신도들이 붓다의 설법을 기리기 위해 깃발로 장식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글ㆍ사진: 강소연(불교문화재학 전공ㆍ중앙승가대학 교수)
<필자 소개>
○강소연: 중앙승가대학(불교문화재학) 교수. 문화재청 전문위원, 조계종 국제위원, 문화창달위원회 위원,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등. 30년 간 오로지 불교문화재를 연구한 베테랑 학자. (경력)홍익대 겸임교수(10년 근속),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BK연구원, 동국대 불교학과 연구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임. 조선일보 공채 전임기자, 대만 국립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 장학연구원, 교토대학 대학원 연구조교 역임. (수상)일본 최고 명예학술상 ‘국화상’ 논문상, 불교소장학자 ‘우수논문상’. (저서)『명화에서 길을 찾다-매혹적인 우리 불화 속 지혜-』(시공아트), 『사찰불화 명작강의』(불광출판사), 『잃어버린 문화유산을 찾아서』(부엔리브로)
○ Copyrightⓒ2018 by Soyon Kang. 저작권자ⓒ‘강소연’ 본 연재 글과 사진의 무단 복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