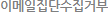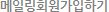계행을 지키는 자가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법하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보시하는 자의 덕행이 보시를 청정하게 만드네.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가 계행을 지키는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여법하지 않게 얻어진 것을 불신의 마음으로 보시하면
보시받는 자의 덕행이 보시를 청정하게 만드네.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가 계행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여법하지 않게 얻어진 것을 불신의 마음으로 보시하면
어느 쪽의 덕행도 보시를 청정하게 만들지 못하네.
계행을 지키는 자가 계행을 지키는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법하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보시는 굉장한 과보를 가져온다고 나는 말한다.
탐욕을 떠난 자가 탐욕을 떠난 자에게
행위의 과보가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법하게 얻어진 것을 흔쾌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 보시는 세간적 보시 가운데 최상이라고 나는 말한다.
- 전재성님 옮김

(ⓒ장명확)
보시의 중요성은 적어도 부처님의 제자들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말이다. 보시는 쓰라리고 기나긴 윤회의 고통을 마감할 때까지 선처에 태어나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자양분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보시를 행하지 않으면 해탈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도처에서 보시를 언급하는 것은 보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필자 역시 이런저런 자리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보시를 언급하면서도, 현실은 보시행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갈 자격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그만큼 보시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보시의 올바른 기준 또는 원칙과 관련해 언급한 대표적인 사례는 양모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한 벌의 새 법복을 가지고 부처님이 고향 까삘라왓투를 방문했을 때 머물던 니그로다 승원으로 찾아와 보시를 청했을 때이다.
고따미가 “세존이시여, 이 한 벌의 새 법복은 특별히 세존을 위하여 제가 손수 짜고 손수 기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이것을 영납하시고, 애민히 여겨 받아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고따미여, 승단에 이것을 보시하십시오. 승단에 보시할 때에 곧 나와 승단을 공양하는 것이 됩니다.” 고따미의 간청과 부처님은 이와 같은 답변을 무려 세 차례나 거듭된다. 모자 사이에서 간청과 거절이 되풀이되자 아난다가 나서 부처님이 보시를 받아들일 것을 청하자, 부처님은 보시와 그 공덕의 크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셨다.
우선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통해 공덕을 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역설하셨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개인에게 보시하는 열네 가지와 승단에 대한 보시 일곱 가지를 설명하셨다. 이에 대한 설법은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제공된 개인적인 보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행해진 것이다. 부처니은 개인적인 보시와 승단에 제공된 보시의 비교적인 가치를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부처님은 보시가 승단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보시의 의도가 승단과 개인 모두에게 행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런 보시의 의도가 그녀에게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공덕을 낳을 것이 때문이었다. 또한 부처님은 후대의 세대가 승단에 존경을 표하도록 고무시키기 위해, 그리고 승단에 네 가지 필수자구를 보시하게 함으로써 가르침이 오래가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 보시의 청정에는 네 가지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시면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보시의 공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설명하셨다. 즉 청정한 것은 공덕을 많이 낳는 것이고, 청정하지 못한 것은 공덕을 낳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시는 <맛지마니까야> 분석의 품 중 ‘보시에 대한 분석의 경(Dakkhiṇāvibhaṅgasutta)’에 등장한다. 부처님이 보시에 대해 분석적으로 설법한 내용을 갈무리해 한 편의 시로 읊으신 것이다.
이 시 가운데 마지막 연은 한 거룩한 님, 즉 아라한이 다른 거룩한 님에게 주는 보시에 대한 내용이다. 거룩한 님은 업의 과보를 믿지만, 존재에 대한 욕망과 탐욕이 없이 보시를 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과보도 낳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보시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