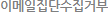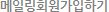수다원과 사다함

(삽화 정윤경)
라자가하에서 소문난 부자상인 마하셋티 까란따 장자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노숙하던 수행자들을 위해 죽림정사를 지어 바쳤기 때문이었다. 그는 고따마 붓다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난 뒤 제자비구들을 이끌고 라자가하 근교의 널따란 대숲에 왔을 때, 그들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정사를 지어 주었던 것이다. 마하셋티 까란따 장자는 거액의 사재를 들여 법당, 차이티아(기도처), 꾸띠(숙소), 화장실 등 60채를 짓고 연못을 조성하고 나서는 붓다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세존이시여, 차이티아와 꾸띠 수십 채와 연못을 완공했습니다. 내일이 회향하는 날이니 부디 오시어 라자가하 사람들에게도 법문을 설해주십시오.”
붓다가 장자의 청을 들어줌으로 해서 라자가하의 죽림정사가 최초의 승원이 됐는데, 붓다가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 뒤 3년 만의 일이었다. 마하셋티 까란따 장자의 가족들은 그가 죽은 뒤에도 승가를 후원해왔고 공양을 올렸다. 죽림정사는 물론 칠엽굴 비구들에게도 수시로 공양을 올렸던 것이다. 그런 날이 되면 라자가하의 거리는 공양물을 실은 수레가 길게 줄을 이었다.
칠엽굴에 5백 장로가 모였으니 마하셋티 까란따 가족들은 더없이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수십 명의 하인들이 들것에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과 과일을 가득 담아 칠엽굴을 오르내렸다. 하인들이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던 마하깟사빠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난다는 그 모습을 보고 기원정사 시절이 생각났다. 탁발할 때 붓다에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만 마하깟사빠는 가난한 이들이 주는 공양을 더 좋아했던 것이다. 금생에 복을 짓지 못하면 내생에도 얼마나 박복한 생활을 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였다. 말하자면 복 짓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내생에는 가난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수부띠는 그 반대였다. 마하셋티 까란따 가족들이 하인들을 시켜 공양 올리는 모습을 보고는 기뻐했다. 수부띠는 마하깟사빠와 달리 생각했다. 가난한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부자들이 부자가 되고자 많은 죄업을 지은즉 보시를 한다면 죄업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두 장로 모두 자비심에서 연유한 판단이었지만 붓다는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차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난다는 그때 붓다의 명쾌한 당부에 감탄했다. 탁발할 때도 차별이 없어야 하고, 공양을 받을 때도 그래야 한다고 믿었다. 붓다의 의식은 늘 장로들보다 한 차원 위였던 것이다. 아난다는 마하셋티 까란따 가족의 공양물이 모두 칠엽굴 앞에 놓인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다. 5백 장로는 동굴 안에 이미 좌정하고 있었다.
아난다는 조금 전과 같이 붓다가 기원정사에서 설한 말씀을 또박또박 암송했다.
<붓다께서 물으셨다.
“수부띠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원한 평안의 흐름을 탄 자(수다원)가
‘나는 영원한 평안의 흐름을 탄 성과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할까?”
수부띠가 대답했다.
“스승이시여,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영원한 평안의 흐름을 탄 자가,
‘나는 영원한 평안의 흐름을 탄 자의 성과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할 까닭이 없습니다.
스승이시여, 실로 그가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평안의 흐름을 탄 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는 형태를 얻는 것도 아니고,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느낌의 대상이나, 마음의 대상이 나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평안의 흐름을 탄 자’로 불리는 것입니다.
스승이시여, 만약에 ‘영원한 평안의 흐름을 탄 자’가
‘나는 영원한 평안의 흐름을 탄 자,라는 성과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에게는 자아에 대한 집착,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 개체에 대한 집착,
개인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난다는 붓다의 ‘영원한 평안’을 ‘깨달음’이란 말로 이해했다. 그리고 ‘흐름을 탄 자’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흐름에 든 자‘로 받아들였다. 굳이 붓다가 강물 같은 ‘흐름’이란 비유로 말한 것은 깨달음을 대하는 중생들의 현상을 둘로 나누어 보았기 때문일 터였다. 하나는 강물 같은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심신을 맡기고 흘러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흐름을 거스르며 살아가는바, 그것은 욕망과 집착의 길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수행자는 흐름과 싸우지 않는 사람이고, 욕망과 집착으로 살아가는 중생은 흐름과 싸우며 갈등하는 사람일 터였다.
또한, 아난다는 수부띠의 대답도 이해했다. ‘영원한 평안의 흐름을 탄 자’가 만약에 ‘나는 영원한 평안의 흐름을 탄 자,라는 성과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면 수부띠의 대답처럼 그것은 집착으로 성취한 성과라고 보아야 옳았다. ‘흐름을 탄 자’는 결코 성과에 집착해서는 안 되었다.
‘흐름을 탄 자’는 ‘흐름에 든 자’와 같을 것인데, 그는 흐름과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굳이 ‘흐름을 탄 자’나 ‘흐름에 든 자’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모든 집착을 놓아버린 무아 상태이므로 흐름과 하나가 되어 흐름이 그를 어쩌지 못하는 ‘흐름을 이긴 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스승 붓다께서 물으셨다.
“수부띠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번만 다시 태어나면 깨닫는 자(사다함)’가
‘한 번만 다시 태어나면 깨닫는 자의 성과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할까?”
수부띠가 대답했다.
“스승이시여, 그러한 일은 없니다.
한 번만 다시 태어나면 깨닫는 자가,
‘나는 한 번만 다시 태어나면 깨닫는 자라는
성과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할 까닭이 없습니다.
한 번만 다시 태어나면 깨닫는 자가 되었다고 할지언정
그 어떤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다시 태어나면 깨닫는 자(사다함)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난다는 붓다의 이 말도 역시 조금 전의 방식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난해하여 조금 깊이 생각해보기는 했지만 결국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없었다. 아난다는 잠시 암송을 멈추었다. 마하깟사빠가 공양한 뒤, 마저 암송하라고 눈짓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아난다는 바로 마하깟사빠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사형께서는 왜 좀 전에 공양물을 오는 것을 보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까?”
“벗이여, 차별하는 마음이 생겨 그런 것은 아니었다오.”
“그렇다면 제가 잠시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사형께서는 아직도 부자의 공양을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줄 알았습니다.”
“스승님의 지적을 받은 뒤로는 수부띠 장로나 나는 공양을 받을 때나 탁발할 적에 차별하는 마음 없이 하고 있습니다.”
5백 장로들 앞으로 마하셋티 까란따 가족들이 올린 공양이 조금씩 놓였다. 짜파티 한 장과 커리, 바나나, 사과 등 과일이 똑같은 분량으로 5백 장로 모두에게 분배되고 있었다. 아난다는 짜파티를 조금 찢어서 커리를 묻히지 않고 입안에 넣었다. 그래야만 밀가루의 구수한 맛이 온전하게 혀에 스며들었다. 아난다는 문득 혀는 맛으로 먹이를 삼고, 여래는 열반으로 먹이를 삼고, 열반은 게으르지 않은 정진을 먹이로 삼는다는 아니룻다 장로에게 설한 붓다의 말씀이 떠올랐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