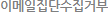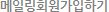무쟁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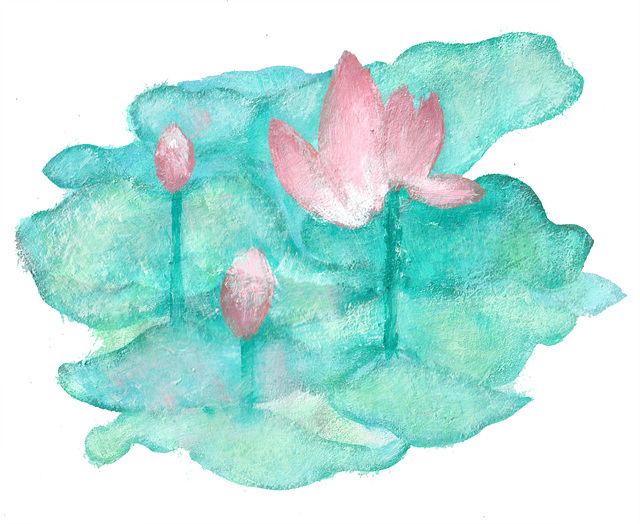
(삽화 정윤경)
마하셋티 까란따 가족의 공양을 받고, 달콤한 짜이를 마신 덕분에 아난다의 목소리는 더욱 밝아지고 또렷했다. 포만감에 느슨해지기는커녕 힘이 단전 부근에 모아진 듯 활기가 서서히 온몸으로 돌았다. 칠엽굴 밖의 삡빨라나무 가지에 앉은 노랑할미새들이 우짖는 소리에 라자가하 산의 모든 이파리들이 팔랑거리는 듯했다.
라자가하 거리를 달리는 마차의 방울소리가 칠엽굴까지 아스라이 들려왔다. 마차끼리 부딪치어 마부들이 큰 소리로 싸우는 다툼의 소리도 칠엽굴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5백 장로들은 그런 새소리 나 마차의 소음과 언쟁이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았다. 오직 붓다가 설한 말씀을 암송해 온 아난다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아난다는 5백 장로를 향해 붓다가 말씀한 ‘다툼과 무쟁(無諍)의 설법’을 암송했다.
<“스승 붓다시여.
여래(붓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아라한), 올바로 깨달은 사람(等正覺)께서
저를 ‘다툼이 없는 경지를 즐기는 으뜸인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스승님이시여, 저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며, 욕망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이시여, 저는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며
욕망을 떠나 있다’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스승님이시여.
만약 제가 ‘나는 존경받을 만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래가 저를 두고, 훌륭한 젊은이인 수부띠가
다툼을 떠난 경지를 즐기는 으뜸인자이며,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다툼을 떠난 자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난다는 ‘다툼이 없는 경지를 즐기는 으뜸인 자’를 무쟁의 제일인자로 이해했다. 무쟁이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은 물론 누구와도 다툼이 없다는 뜻이었다. 아난다는 기원정사 시절 스승 붓다의 말씀을 듣는 동안 수부띠가 존경스럽기 짝이 없었다. 붓다께서 ‘훌륭한 젊은이 수부띠가 다툼이 없는 경지를 즐기는 제일인자’라고 말씀했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날 붓다께서 설한 <금강경>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수부띠가 주인공이 되어 붓다와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를 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붓다께서는 제자 비구들 가운데 일부가 관념적인 어떤 주제를 놓고 다툼을 즐기거나 논쟁을 일삼기 때문에 수부띠를 통해 중도를 깨닫고 팔정도를 실천하는 비구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고 강조했을지도 몰랐다. 붓다는 <금강경> 뿐만 아니라 기원정사 시절 이전에도 여러 번 무쟁법문(無諍法門)으로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다. 일찍이 붓다가 설한 <무쟁분별경>이 있을 정도였다.
<“비구들이여, 성자의 행위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천하고 무익한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을 탐하는 것은 피해가 따르고, 근심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는 불행에 빠지는 삿된 길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다툼’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성자의 행위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천하고 무익한 쾌락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을 탐하지 않는 것은 피해가 없고, 근심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불행에 빠지는 않는 바른 길(八正道)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무쟁’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성자의 행위가 아닌
고통스럽고 무익한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에만 집착하는 것은
피해가 따르고, 근심이 따르고, 괴로움이 따르는
불행에 빠지는 삿된 길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다툼’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성자의 행위가 아닌
고통스럽고 무익한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피해가 없고, 근심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불행에 빠지지 않는 바른 길(八正道)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무쟁’이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여래가 깨달은 중도(中道)는
안목이 생기고, 앎이 생기며,
평안과 탁월한 지혜와 깨달음의 열반으로 이끌며,
피해가 없고, 고통이 없고,
불행에 빠지지 않는 바른 길(八正道)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무쟁’이라고 한다.
(중략)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우리는 이제 ‘다툼’을 알고, ‘무쟁’을 알아야 한다.
‘다툼’과 ‘무쟁’을 깨닫고 무쟁의 길을 가겠다’고 수행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훌륭한 젊은이 수부띠가 ‘무쟁의 길’을 가는 사람이니라.”>
뿐만 아니라 <다툼의 경>에서도 붓다는 다음과 같이 설했던 것이다.
<“세상에서 다투고, 싸우고, 언쟁을 일으키며
서로 입에 칼을 물고 찌르는 비구들이 사는 곳은
생각만 해도 불안하니라.
(중략)
화합하고, 기뻐하고, 언쟁을 하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화합하여
서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대하는
비구들이 사는 곳은 평안한 곳이니라.”>
또한 <꿀 덩어리 경>에서도 붓다는 비구들에게 고행과 쾌락을 버린 중도와 팔정도의 실천이 ‘무쟁의 길’이라고 설했다. 물론 <금강경>과 달리 <무쟁분별경>이나 <꿀 덩어리 경>이나 <다툼의 경>은 붓다께서 기원정사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머물 때 설한 경이었다. 특히 <다툼의 경>은 붓다께서 코삼비에 가 있을 때 설한 경으로 그곳의 사원에 있는 비구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아난다는 실감했다. 오죽하면 붓다께서 ‘서로 입에 칼을 물고 찌르는 비구들이 사는 곳은 불안하다’고 했을까 싶었다.
아난다는 ‘무쟁’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러니까 중도와 팔정도 속에서의 ‘무쟁삼매’란 자신의 내면적 고뇌와 다른 동료비구들과의 논쟁이 사라진 삼매를 뜻하는 것이었다. 갈등의 대상인 자신의 안과 밖의 집착이 사라진다면 물이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화합하고 화목하여 마음은 평온한 경지에 머물 수 있고, 또 그것을 즐기는 상태가 될 터였다.
아난다는 심호흡을 했다. 앞으로 암송할 부분은 이제까지와 사뭇 달랐다. 계속해서 집중하고 자신의 기억을 더욱 섬세하게 떠올리며 암송해야 할 붓다의 말씀들이었다. 아난다는 마하깟사빠와 수부띠, 아니룻다, 목갈라나 등등 장로사형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아난다가 암송하는 것에 흡족하다는 표정이 틀림없었다.
암송하던 아난다는 사형들의 표정을 보고서 안심했다. 뿐만 아니라 붓다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붓다를 25년 동안 날마다 하루 종일 시봉했기 때문에 5백 장로들처럼 홀로 앉아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며 수행하는 치열한 시간은 없었지만, 그래도 스승 붓다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들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조금 전까지도 삡빨라나무 가지에 앉아서 우짖던 노랑할미새들도 붓다가 말씀한 ‘다툼과 무쟁의 설법’을 들었는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삡빨라나무 이파리 사이사이에 앉아 아난다가 암송하는 붓다가 말씀한 ‘다툼과 무쟁의 설법’에 감응하여 5백 장로들처럼 가부좌를 틀고 있는 듯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