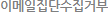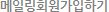수덕사 소조불좌상(사진=미디어붓다)
수덕사 소조불좌상(사진=미디어붓다)
저열한 사유, 미세한 사유가
따라오며 정신을 혼란시킨다.
이러한 정신에 나타나는 사유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마음은
이리저리 달린다.
정신에 나타나는 사유들을
자각하고
정진과 새김을 갖추어
정신을 수호하는 깨달은 님은
정신을 따라오며 그것을 표류시키는
그 사유들을 남김없이 여읜다.
- 전재성 옮김
사유(思惟)는 마주치는 대상에 대해 두루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철학적으로는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따위 등을 행하는 인간의 정신 작용을 의미한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어떤 대상과 나의 감각기관이 접촉할 때 생기는 마음을 내키는 대로 이리저리 굴리거나 이성으로 제어하는 작용이다. 일어나는 사유를 알지 못하고 그것에 휘둘려 갈팡질팡한다면 정신이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 정신이 혼란해지면 어떤 것이든 낭패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당연히 사유에는 이익이 되는 사유와 손해가 되는 사유가 있다. 짧거나 저열한 사유는 손해가 되는 사유일 것이고, 깊거나 고준한 사유는 좋은 사유일 것이다. 저열한 사유는 정신을 혼란시키고, 고준한 사유는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시켜 준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매 순간 일어나는 사유를 어떻게 잘 제어할 것인가는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된다. 문제는 결코 사유를 잘 제어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좋은 사유, 올바른 사유를 갖는다는 것은 범부에게는 물론이고 수행자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적지 않은 수행자들이 저열한 사유에 휩싸여 좌절하거나 수행을 포기하려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부처님의 시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메기야(Meghiya) 존자도 사유를 알지 못해 곤욕을 치렀던 수행자 가운데 한 분이었다. 그는 짤리까 시의 짤리까 산의 한 승원에 부처님이 머무실 때 부처님을 시봉 했다. 어느 날 그가 근처의 마을로 탁발을 나갔다가 끼미깔라(Kimikālā) 강변을 찾아가서 이리저리 거닐며 산책하다가 아름답고 즐길만한 망고나무 숲을 보고는, 이곳이야말로 훌륭한 가문출신인 자신이 정진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끼미깔라 강변의 망고나무 숲에서 정진하고 싶다며 허락해 줄 것을 청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직 메기야의 지혜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음을 알고 다른 수행승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했지만, 세 번에 걸친 간곡하고도 강력한 메기야 존자의 거듭된 요청에 허락을 해주었다. 원한대로 망고나무숲에서 정진하게 된 메기야는 숲의 한 나무 밑에 앉아 수행을 시작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메기야에게 세 가지의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가 일어났다. 감각적 쾌락에 매인 사유, 분노에 매인 사유, 폭력에 매인 사유가 일어난 것이다. 자신에게 악하고 불건전 사유가 일어난 것을 알고 놀란 메기야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에게 예전에는 없었던 놀라운 일, 사유가 일어났다고 알리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마음에 의한 해탈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 성숙에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원리를 자세하고도 쉽게 설명해 주셨다. 다섯 가지 원리는 첫째 선한 벗, 선한 친구, 선한 동료와 함께 할 것, 둘째 계행을 지니고 계율의 항목을 수호하고 알맞은 행동과 행경을 갖추고 아주 작은 잘못에서 두려움을 보고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배울 것, 셋째 버리고 없애는 삶을 사는 것과 함께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되고, 오로지 싫어하여 떠나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적멸하여, 곧바로 알고, 올바로 깨닫고 열반에 드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얻을 것, 넷째 악하고 불건전한 원리를 제거하고 착하고 건전한 원리를 갖추기 위해 열심히 정진할 것, 다섯째 지혜로워 고귀한 꿰뚫음으로 올바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생성과 소멸에 대한 지혜를 갖출 것 등이다.
이어 부처님은 덧붙여 네 가지 원리를 닦으라고 가르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첫째 탐욕의 제거를 위해 부정(不淨)을 닦을 것, 둘째 분노의 제거를 위해 자애를 닦을 것, 셋째 사유의 제거를 위해 호흡에 대한 새김을 닦을 것, 넷째 ‘내가 있다’는 자만의 제거를 위해 무상에 대한 지각을 닦을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 원리와 네 가지 원리를 가르쳐주신 부처님은 메기야 존자에게 무상에 대한 지각을 이루면, 무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지고, 무아에 대한 지각을 이루면 ‘내가 있다’는 자만은 제거되고 현세에서 열반을 이룬다고 가르치셨다.
부처님의 이 시는 <쿳다까니까야> ‘우다나(Udāna) - 감흥 어린 시구’의 메기야의 품 <메기야의 경>에 나온다. 부처님은 아직 마음이 성숙되지 않은 메기야가 아름답고 좋은 장소에 취해 그곳에서 수행하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난 후 겪은 저열한 사유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는 가르침을 설한 후 이 시를 읊으신 것이다.
- 시구 ‘저열한 사유’는 세 가지의 악한 사유, 즉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매인 사유, 분노에 매인 사유, 폭력에 매인, 비교적 거친 사유를 말한다.
- 시구 ‘미세한 사유’는 ‘친지에 대한 사유, 지방에 대한 사유, 죽지 않으려는 것에 대한 사유, 타인을 걱정하는 것에 대한 사유, 이익과 명예와 칭송에 대한 사유, 경멸받지 않으려는 것에 대한 사유’를 말한다.
- 시구 ‘방황하는 마음은 이리저리 달린다.’는 잘못된 사유를 버리지 않고 동요하는 마음이 어떠한 형상이든지 소리이든지 등 그때 그때 대상에 따라 그 유혹 때문에 계속 달려간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무지와 갈애로 인해 동요하는 정신 때문에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몸을 받고 놓으면서 계속 달리는 윤회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 시구 ‘정신에 나타나는 사유들을 자각하고’는 마음의 일어남을 원인으로 정신에 이는 사유를 통찰지혜를 수반하는 길의 지혜로 올바로 아는 것을 말한다.
- 시어 ‘정진’은 올바른 정진으로, 방지의 노력, 버림의 노력, 수행의 노력, 수호의 노력을 말한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불건전한 상태는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고, 이미 일어난 불건전한 상태는 버리기 위해 책려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전한 상태는 일으키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고, 이미 생겨난 건전한 상태는 유지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증가시키고 성만 하게 하며 충만하도록 의욕을 일으키고 정근하는 것을 말한다.
- 시어 ‘새김’은 사념처(신수심법), 즉 네 가지 새김의 토대를 찰나 찰나 놓치지 않고 관찰하하는 것을 말한다.
- 시구 ‘정신을 따라오며 표류시키는’은 사유가 일어나면, 의식이 배타적으로 따라붙어 사유가 그것을 대상으로 심어놓는 현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