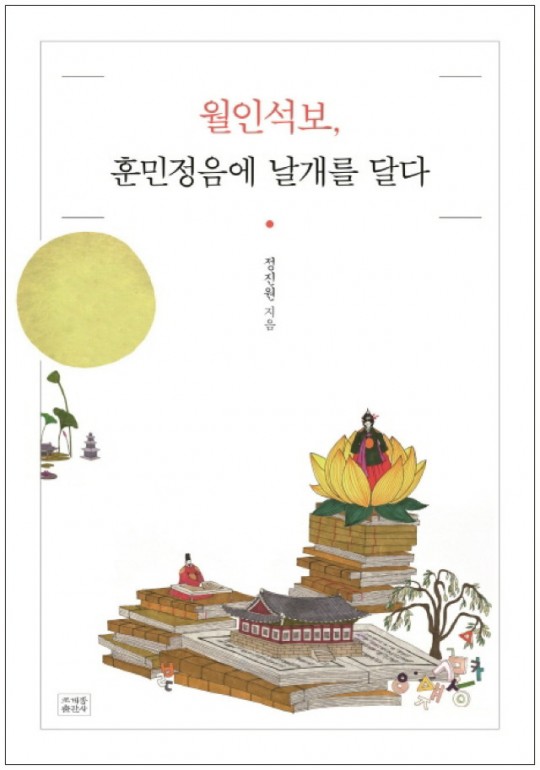문화ㆍ예술 > 이학종의 ‘불교명저 산책’
600년 만에 월인석보를 해방하다
이학종 urubella@naver.com 2019-11-20 (수) 09:34
불교신간산책 11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날다> 정진원 지음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함께 잘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공을 따지는 학자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세종과 수양(세조)이 함께 지은 <월인석보>는 그동안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학자를 만나지 못했기에, 그 내용과 가치가 지금까지 제한되게 알려진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월인석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즉 ‘국어학’과 ‘불교학’ 두 분야에 정통해야만 했다. 그러나 국어를 전공한 이는 불교를 모르고, 불교를 전공한 이는 국어를 모르는 한계가 극복되지 못했다. 따라서 <월인석보>는 그 이름만 알려졌을 뿐, 내용은 사람들의 관심을 거의 끌 수 없었다. 그런데 드디어 불교학과 국어학을 함께 전공한 학자가 나타났고, 그의 공력에 힘입어 <월인석보>가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조계종출판사 펴냄)라는 이름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월인석보>가 약 600년 만에 해방을 맞은 것이다.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함께 잘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공을 따지는 학자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세종과 수양(세조)이 함께 지은 <월인석보>는 그동안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학자를 만나지 못했기에, 그 내용과 가치가 지금까지 제한되게 알려진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월인석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즉 ‘국어학’과 ‘불교학’ 두 분야에 정통해야만 했다. 그러나 국어를 전공한 이는 불교를 모르고, 불교를 전공한 이는 국어를 모르는 한계가 극복되지 못했다. 따라서 <월인석보>는 그 이름만 알려졌을 뿐, 내용은 사람들의 관심을 거의 끌 수 없었다. 그런데 드디어 불교학과 국어학을 함께 전공한 학자가 나타났고, 그의 공력에 힘입어 <월인석보>가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조계종출판사 펴냄)라는 이름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월인석보>가 약 600년 만에 해방을 맞은 것이다.
이 귀한 작업을 해낸 학자는 정진원 박사(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이 책의 저자 정진원 교수가 <월인석보> 스물다섯 권 중 첫 권을 현대국어로 옮기고 다듬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 세상에 선보였다.
세조의 절절한 사모곡과 사부곡, 자식 잃은 아비의 슬픔과 왕이 되기 위해 저질렀던 잘못의 참회로 가득한 <월인석보>의 서문으로부터 석가모니의 과거세 연등불 시절 선혜와 구이 이야기,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 모계 중심의 사회로 시작되는 인간 세계의 불교식 창세기가 <월인석보> 본문에 광대한 스케일로 촘촘히 실려 있다. 그 도저하고 유장하고 사무치는, 15세기까지 이어진 우리 선조의 정수를 담은 불교 이야기 <월인석보>는 현재 25권 중 19권이 발견된 상태로, 저자는 전권 번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자는 주석을 일일이 풀이하기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이 유려한 수양대군의 육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세주와 본문을 풀이했다.
세조의 절절한 사모곡과 사부곡, 자식 잃은 아비의 슬픔과 왕이 되기 위해 저질렀던 잘못의 참회로 가득한 <월인석보>의 서문으로부터 석가모니의 과거세 연등불 시절 선혜와 구이 이야기,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 모계 중심의 사회로 시작되는 인간 세계의 불교식 창세기가 <월인석보> 본문에 광대한 스케일로 촘촘히 실려 있다. 그 도저하고 유장하고 사무치는, 15세기까지 이어진 우리 선조의 정수를 담은 불교 이야기 <월인석보>는 현재 25권 중 19권이 발견된 상태로, 저자는 전권 번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자는 주석을 일일이 풀이하기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이 유려한 수양대군의 육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세주와 본문을 풀이했다.
<월인석보>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책으로 최초의 조선대장경, 조선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자식 잃은 아비 세조가 돌아가신 부모님께 바치는 절절한 사부곡이자 사모곡이기도 하다.
1446년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10개월 만인 1447년 7월 칠석에 수양에 의해 24권의 대작 <석보상절>이 완성되었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 세종이 단숨에 노래를 지었으니 바로 600수에 가까운 <월인천강지곡>이다. 1446년은 훈민정음이 반포된 해이면서 동시에 세종과 세조에게는 그해 3월 아내이자 어머니인 소헌왕후를 여읜 해이다. 나이 쉰의 아비와 서른의 아들이 세상이 무너지고 의지할 데 없는 큰 슬픔 속에 오직 바라는 한 가지는 소헌왕후의 극락왕생이었다. 때마침 그들에게는 출시를 앞둔, 세상을 가르칠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이 있었다. 이 새 문자로 먹고 자는 것도 잊을 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두 부자의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2년이 지난 1459년 세조는 고인이 된 부모님과 요절한 아들 의경세자를 위하여 <월인천강지곡>의 ‘월인’과 <석보상절>의 ‘석보’를 따서 합한 책 <월인석보>를 만들었다.
세조 5년, 1459년 집권도 안정적이고 한숨 돌리는 시간, 그는 수양대군 시절 아버지 세종의 명에 따라 만들었던 <석보상절>을 다시 펼쳐들었다. 개인적으로 슬픈 일도 많았지만 이 <월인석보> 작업을 할 때에는 식음을 잊고 바쁜 정사에서 시간을 쪼개가며 틈을 내어 하였다는 기록이 <월인석보>의 서문에 수록되어 있다.
1446년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10개월 만인 1447년 7월 칠석에 수양에 의해 24권의 대작 <석보상절>이 완성되었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 세종이 단숨에 노래를 지었으니 바로 600수에 가까운 <월인천강지곡>이다. 1446년은 훈민정음이 반포된 해이면서 동시에 세종과 세조에게는 그해 3월 아내이자 어머니인 소헌왕후를 여읜 해이다. 나이 쉰의 아비와 서른의 아들이 세상이 무너지고 의지할 데 없는 큰 슬픔 속에 오직 바라는 한 가지는 소헌왕후의 극락왕생이었다. 때마침 그들에게는 출시를 앞둔, 세상을 가르칠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이 있었다. 이 새 문자로 먹고 자는 것도 잊을 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두 부자의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2년이 지난 1459년 세조는 고인이 된 부모님과 요절한 아들 의경세자를 위하여 <월인천강지곡>의 ‘월인’과 <석보상절>의 ‘석보’를 따서 합한 책 <월인석보>를 만들었다.
세조 5년, 1459년 집권도 안정적이고 한숨 돌리는 시간, 그는 수양대군 시절 아버지 세종의 명에 따라 만들었던 <석보상절>을 다시 펼쳐들었다. 개인적으로 슬픈 일도 많았지만 이 <월인석보> 작업을 할 때에는 식음을 잊고 바쁜 정사에서 시간을 쪼개가며 틈을 내어 하였다는 기록이 <월인석보>의 서문에 수록되어 있다.
다 알다시피 조선은 ‘유교’를 국시로 삼고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을 펼쳤다. 심지어 세종은 삼국시대 이래 고려시대 불교를 대표하는 다섯 가지 교종과 아홉 산문에 자리 잡았던 선종 5교 9산을 혁파하고 선종과 교종 곧 선교 양종으로 불교를 대폭 축소시킨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런 세종이 왕자였던 수양대군에게 <석보상절>을 짓고 서문을 쓰게 한 사실이 <월인석보> 서문에 자세하게 전한다.
<석보상절>은 석가모니께서 태어나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일생과 설법한 경전 내용(釋譜)을 자세히 할 것은 자세히 하고(詳) 간략히 할 것은 간략하게(節) 편집한 조선시대 최초의 ‘훈민정음 불경’이다. <월인천강지곡>은 불교의 진리를 상징하는 달은 하나이지만 지상에 있는 천 개의 강에 똑같이 도장 찍히는 것처럼 부처의 진리가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석보상절>의 내용을 게송처럼 요약한 것이다. 불교 경전의 일반적인 형식은 부처님의 설법을 전한 뒤에 이를 요약한 게송이 이어지는 순서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최초 조선대장경도 제목이 ‘석보+월인’이 되어야 하지만 수양은 세조가 된 뒤 5년 후인 1459년 아버지 세종의 노래 <월인천강지곡>을 앞세우고 아들인 자신이 쓴 <석보상절> 산문 순서를 뒤로 하여 ‘월인+석보’의 순서로 만들었다. 이른바 조선식 대장경 편집의 시작이다. 이 책은 만든 기간은 1년이 채 안 되지만 조선시대까지 유통되고 가장 많이 회자된 불교 경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경, 율, 론’ 삼장을 망라하여 엄선 또 엄선한 요체들을 모아서 ‘각별히’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석보상절>은 석가모니께서 태어나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일생과 설법한 경전 내용(釋譜)을 자세히 할 것은 자세히 하고(詳) 간략히 할 것은 간략하게(節) 편집한 조선시대 최초의 ‘훈민정음 불경’이다. <월인천강지곡>은 불교의 진리를 상징하는 달은 하나이지만 지상에 있는 천 개의 강에 똑같이 도장 찍히는 것처럼 부처의 진리가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노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석보상절>의 내용을 게송처럼 요약한 것이다. 불교 경전의 일반적인 형식은 부처님의 설법을 전한 뒤에 이를 요약한 게송이 이어지는 순서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최초 조선대장경도 제목이 ‘석보+월인’이 되어야 하지만 수양은 세조가 된 뒤 5년 후인 1459년 아버지 세종의 노래 <월인천강지곡>을 앞세우고 아들인 자신이 쓴 <석보상절> 산문 순서를 뒤로 하여 ‘월인+석보’의 순서로 만들었다. 이른바 조선식 대장경 편집의 시작이다. 이 책은 만든 기간은 1년이 채 안 되지만 조선시대까지 유통되고 가장 많이 회자된 불교 경전,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경, 율, 론’ 삼장을 망라하여 엄선 또 엄선한 요체들을 모아서 ‘각별히’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월인석보> 서문에는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저간의 사정이 잘 설명되어 있다. 먼저 12부 수다라를 섭렵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12부 수다라는 12부경이라고도 하는 석가모니의 교설을 12가지로 분류한 경전이라는 뜻이다. 물론 세종과 세조도 불교에 조예가 깊고 세상이 다 아는 박학다식한 천재들이었다. 그러나 저자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석보상절> 뒤에 김수온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월인석보> 뒤에는 신미 대사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점에 주목해야 한다. 김수온은 신미 대사의 동생으로 1446년 <증수석가보(增修釋迦譜)>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월인석보>에는 훈민정음 창제부터 깊이 관여하고 왕들이 스승으로 추앙해 신하들의 질시를 한 몸에 받았던 신미 대사의 자취가 남아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지 앞으로 훈민정음 불경을 차근차근 천착하며 밝혀내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저자는 <월인석보>를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문자 훈민정음, 21세기 세계 유산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월인석보>에는 15세기 국어대사전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세주(細註)가 가득하다. 세주는 협주(夾註)라고도 하는데 본문 다음에 작은 글자 두 줄씩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부(夫)는 말씀 시작하는 곁에 쓰는 글자이다. 진원(眞源)은 진실의 근원이다”와 같이 본문의 내용을 쉽게 풀이하고 정의하는 방식이다.
<월인석보>는 한문이 크고 굵은 글씨로 먼저 나오고 한 칸 내려서 훈민정음으로 그 내용을 풀어 쓰는 형식이 잘 나타나 있다. 책의 저자가 높여야 할 부처라든지 왕인 경우에는 이처럼 줄을 바꾸어 대우를 달리한다. 같은 왕이지만 아들 세조가 아버지 세종을 호명한다든지 높여야 할 인물을 써야 할 경우에도 줄을 바꾼다. 또 <석보상절>보다 훨씬 내용이 자세하고 철학적이다. 마치 훈민정음을 학습하고 ‘팔상도’를 이해한 사람이 처음으로 12부 불교 경전을 샅샅이 참조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확신이 들 때까지 수정하고 또 수정하며 의심나면 백방에 물어 해결하듯이 불교의 근본과 진리의 궁극을 마침내 꿰뚫고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자문을 구한 인물들이 세주 주석에 나온다. 곧 혜각존자 신미(信眉)와 판선종사 수미(守眉), 판교종사 설준(雪埈), 연경사 주지 홍준(弘濬), 전 회암사 주지 효운(曉雲), 전대자사 주지 지해(智海), 전소요사 주지 해초(海招), 대선사 사지(斯智), 학열(學悅), 학조(學祖), 가정대부동지중추원사 김수온(金守溫)이 그들이다.
<월인석보> 1권의 이야기는 모두 10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을 읽노라면 108 염주 한 알 한 알을 실에 꿰듯이, 108배 한 절 한 절마다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느낌이 든다. 인생의 무상함이 사무치게 느껴지는, 그럴수록 걸음마 시작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음을 떼듯 만고의 진리를 배우게 하는 글이다.
<월인석보>는 한문이 크고 굵은 글씨로 먼저 나오고 한 칸 내려서 훈민정음으로 그 내용을 풀어 쓰는 형식이 잘 나타나 있다. 책의 저자가 높여야 할 부처라든지 왕인 경우에는 이처럼 줄을 바꾸어 대우를 달리한다. 같은 왕이지만 아들 세조가 아버지 세종을 호명한다든지 높여야 할 인물을 써야 할 경우에도 줄을 바꾼다. 또 <석보상절>보다 훨씬 내용이 자세하고 철학적이다. 마치 훈민정음을 학습하고 ‘팔상도’를 이해한 사람이 처음으로 12부 불교 경전을 샅샅이 참조하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확신이 들 때까지 수정하고 또 수정하며 의심나면 백방에 물어 해결하듯이 불교의 근본과 진리의 궁극을 마침내 꿰뚫고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자문을 구한 인물들이 세주 주석에 나온다. 곧 혜각존자 신미(信眉)와 판선종사 수미(守眉), 판교종사 설준(雪埈), 연경사 주지 홍준(弘濬), 전 회암사 주지 효운(曉雲), 전대자사 주지 지해(智海), 전소요사 주지 해초(海招), 대선사 사지(斯智), 학열(學悅), 학조(學祖), 가정대부동지중추원사 김수온(金守溫)이 그들이다.
<월인석보> 1권의 이야기는 모두 10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을 읽노라면 108 염주 한 알 한 알을 실에 꿰듯이, 108배 한 절 한 절마다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느낌이 든다. 인생의 무상함이 사무치게 느껴지는, 그럴수록 걸음마 시작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음을 떼듯 만고의 진리를 배우게 하는 글이다.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는 에세이처럼 읽히지만 국어학과 불교학을 함께 전공한 저자의 공력이 스며든 역작이다. 이제 우리 고전도 학문의 세계에 갇혀 있기보다 이렇게 대중과 만나는 시도를 통해 현대에 살아 있는 고전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이 우리 고전의 대중화를 넘어 전 세계에 K-Classic으로 한류의 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또한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가장 먼저 한글로 지어진 책들이 불전(佛典)이었다는 점은 아직도 한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불교계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불교를 한글로 쉽게 풀어냄으로써 만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했던 세종과 수양의 단심이, 불경이 아닌 외려 성경에 적용된 한국종교사의 아이러니를 오늘의 불자들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자 정진원은?
홍익대학교에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를 주제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국어학자이다. 이후 동국대학교에서 삼국유사를 주제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다. 훈민정음 불경과 삼국유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강의와 글쓰기에 주력하고 있다. <중세국어의 텍스트언어학적 접근 방법>,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 <삼국유사, 자장과 선덕의 신라불국토 프로젝트> 등의 저서가 있다.
기사에 만족하셨습니까?
자발적 유료 독자에 동참해 주십시오.
자발적 유료 독자에 동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