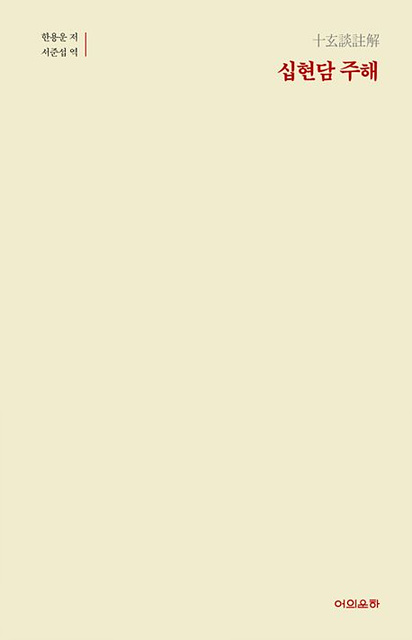출판
한용운의 『십현담 주해』 번역 출간
염정우 기자 bind1206@naver.com 2023-08-02 (수) 09:30
3·1운동에 불교계 민족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가했다가 수감되어 옥고를 치른 후, 1922년 감옥에서 나온 승려 한용운(1879~1944)은 설악산으로 들어가 오세암(백담사 암자)에 칩거하면서 1925년 여름 연달아 두 권의 책을 완성한다. 한문체 『십현담 주해』(1926)와 국문체 시집 『님의 침묵』(1926)이 그것이다. 『십현담 주해』가 『님의 침묵』보다 두 달 정도 먼저 탈고(1925. 6.)되었다. 때문에 『님의 침묵』을 이해하려고 할 때 반드시 정독해야 할 텍스트가 바로 이 『십현담 주해』다. 이 둘은 모두 설악산 시대에 쓰여진 한용운의 대표작으로서 이듬해 서울에서 나란히 출판되었다.
을축년 내가 오세암五歲庵에서 여름을 지낼 때 우연히 『십현담十玄談』을 읽었다. 『십현담』은 동안상찰同安常察 선사가 지은 선화禪話이다. 글이 비록 평이하나 뜻이 심오하여 처음 배우는 사람은 그 유현幽玄한 뜻을 엿보기 어렵다.
원주原註가 있지만 누가 붙였는지 알 수 없다. 열경悅卿의 주석도 있는데, 열경은 매월梅月 김시습金時習의 자字이다. 매월이 세상을 피하여 산에 들어가 중옷을 입고 오세암에 머물 때 지은 것이다. 두 주석이 각각 오묘함이 있어 원문의 뜻을 해석하는 데 충분하지만, 말 밖의 뜻에 이르러서는 나의 견해와 더러 같고 다른 바가 있었다.
대저, 매월에게는 지키고자 한 것이 있었으나 세상이 용납하지 않아 운림雲林에 낙척落拓한 몸이 되어, 때로는 원숭이와 같이 때로는 학과 같이 행세하였다. 끝내 당시 세상
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천하만세天下萬世에 결백하였으니, 그 뜻은 괴로운 것이었고 그 정情은 슬픈 것이었다. 또 매월이 『십현담』을 주석註釋하였던 곳이 오세암이고, 내가 열경의 주석을 읽었던 것도 오세암이다. 수백 년 뒤에 선인先人을 만나니 감회가 오히려 새롭다. 이에 『십현담』을 주해註解한다.
『십현담 주해』가 입산 이후의 그의 선학 사상의 요체를 담은 것이라면, 『님의 침묵』은 그가 한문체 아닌 국문체로 시를 쓰는 근대 시인으로서의 전신과 시인으로서의 재능을 증명한 것이다. 그는 『님의 침묵』 한 권으로 불후의 시인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십현담 주해』의 저 현묘한 선禪의 세계의 침잠과 선적 사유가 놓여 있었다. 이 둘은 서로서로 비추는 거울과 같은 책으로서 설악산 시대의 ‘2부작’이라 할만하다.
『십현담 주해』는 한용운이 남긴 유일한 선학 텍스트 주해서이다. 특히 이 책에서 한용운은 주해자로서 자신이 직접 주장자를 든 선사의 모습으로 여러 번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를 단순한 승려 아닌 선사라고 지칭할 때 선사로서의 진면목은 바로 이 저서에 들어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용운 연구에서 『님의 침묵』에 비해 별로 주목되지도 널리 읽어지지도 않았고, 제대로 이해되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본문이 전부 한문체인데다 중국 10세기 선사 동안상찰(同安常察, ?~961)의 『십현담』을 주해한, 난해한 선학 텍스트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한용운의 선사상의 요체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이와 관련지어 『님의 침묵』을 읽고자 한다면, 『십현담 주해』를 먼저 정독하고 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십현담 주해』는 선사로서의 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저서이며, 그의 글쓰기에서 중요한 고비를 이루는 작품이다. 단순한 뜻풀이 수준의 책이 아니라, 주해註解 형식을 빌어 자신의 깨달음과, ‘정위正位’와 ‘편위偏位’의 겸대兼帶의 선禪, 정위는 다른 갖가지 길과 다르지 않다는 선사상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책이다.
『십현담 주해』는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유마경』 번역, 그리고 소설창작으로 이어진 그의 사유와 글쓰기의 전 과정에서 보면 중간 단계 저서지만, 그의 생애에서 보면 3·1운동 후 삶의 기로 속에서 삶의 비전을 모색하는 가운데 만난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의 『십현담 요해』를 읽으며, 그 자신의 오랜 과제였던 선학의 중요한 결실을 보여준 저술이다. 한용운의 생애의 글쓰기에서 모든 저작이 중요하겠지만, 『십현담 주해』를 빼놓고 그의 선불교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책 『십현담 주해』
한용운 저. 서준섭 역 / 도서출판 어의운하
127 * 197 * 17 mm / 214쪽
정가 12,000원
저자(글) 한용운 충남 홍성에서 1879년생. 법호는 만해, 법명은 용운. 1905년(27세)에 백담사 연곡화상에게 출가했다. 1910년(32세) 『조선불교유신론』을 백담사에서 탈고, 1914년(36세) 『불교대전』을 범어사에서 발행, 1918년 불교잡지 『유심』을 창간했다. 1925년 『십현담 주해』, 『님의 침묵』을 오세암에서 탈고했다. 1931년(53세) 월간 『불교』를 인수하였고, 청년승려비밀결사 만당卍黨의 영수로 추대됐다. 1940년 『유마힐소설경』을 월간 『불교』 2월호에 연재 시작, 1944년(66세)에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입적했다. 번역 서준섭 강원도 강릉 출생.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 현대문학 전공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에 『한국 모더니즘 문학 연구』(1988), 『감각의 뒤편』(1995), 『한국 근대문학과 사회』(2000), 『문학극장』(2002), 『생성과 차이』(2004), 『창조적 상상력』(2009), 『강원 문화 산책』(2010) 등이 있다. 현재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
목차 역자 서문 007 1 십현담 주해 011 마음(心印) 015 조사의 뜻(祖意) 025 현묘한 기틀(玄機) 036 티끌은 다른가(塵異) 046 가르침(演敎) 056 근본에 이르다(達本) 067 귀향마저 부정하다(破還鄕) 076 위치를 바꾸다(轉位) 085 기틀을 돌리다(廻機) 094 일색(一色) 104 유위법과 무상을 반복해 말하다. 219 최후의 가르침 225 2 십현담(원문) 115 3 한용운의 『십현담 주해』 읽기(해설) 137 |
자발적 유료 독자에 동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