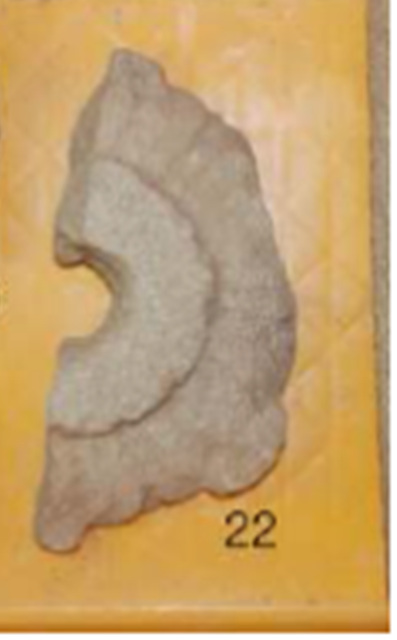지난연재 > 김태형의 부석사이야기
보물 제249호 삼층석탑, 의상 스님 부도 가능성 있어
김태형 jprj44@hanmail.net 2015-04-20 (월) 10:04
“이 절은 의상조사께서 중국인 서화(西華)에 유학하여 화엄(華嚴)의 법주(法炷)를 지엄(智儼)으로부터 전해 받고 귀국하여 창건한 사찰이다. 본당(本堂)인 무량수전(無量壽殿)에는 오직 아미타불의 불상만 봉안하고 좌우보처(左右補處)도 없으며 또한 전전(殿前)에 영탑(影塔)도 없다.
제자가 그 이유를 물으니 의상(義相) 스님이 대답하기를, 법사(法師)이신 지엄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승(一乘) 아미타불(阿彌陀佛)은 열반에 들지 아니하고 시방정토(十方淨土)로써 체(體)를 삼아 생멸상(生滅相)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에 이르기를,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로부터 관정(灌頂)과 수기(授記)를 받은 이가 법계(法界)에 충만하여 그들이 모두 보처(補處)와 보궐(補闕)이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지 않으신 까닭에 궐시(闕時)가 없으므로 좌우보처상을 모시지 않았으며 영탑(影塔)을 세우지 아니한 것은 화엄(華嚴) 일승(一乘)의 깊은 종지(宗旨)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였다.” 경북도유형문화재 제127호 원융국사비 비문 중에서.
범종루 아래 있는 경북도유형문화재 제130호 삼층석탑. 원 출토지는 부석면 북지리 178번지, '방동 절터'다.
현재 부석사에는 모두 3기의 석탑이 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북도유형문화재 제130호인 2기의 석탑은 보물 제220호 석조여래좌상 출토지인 부석사 동쪽 절터(북지리 178번지)에 무너져 있던 것을 옮겨온 것이다.(일부 부석사 관련 책과 논문 등에서는 절의 동쪽 약사골 절터에서 옮겨왔다고 했으나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 약사골은 현재 부석사 원융국사비각과 동부도밭 사이의 계곡이다.)
이 석탑은 현재 범종루 아래 동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탑 앞에 탑의 이운과정은 설명한 작은 표석이 있다. 이 표석에 따르면 1966년 8월 11일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에서 출토된 석존사리 5과를 서쪽 탑에 분안하여 봉안했다고 기록돼 있다.
동탑은 높이 3.6m, 서탑은 3.77m로 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신라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다. 석탑의 상륜부는 모두 유실되었지만 2014년 4월 원래 석탑이 있던 곳에 대한 긴급구제발굴을 통해 상륜부의 보개(寶蓋) 일부가 발견되어 현재 동양대박물관에 수장(收藏)되어 있다.
2014년 4월 발견된 경북도유형문화재 제130호 삼층석탑의 보륜.
글의 시작에 원융국사 비문을 언급한 것은 다름 아닌 보물 제249호 삼층석탑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이 비문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지 않으신 까닭에 궐시(闕時)가 없으므로 좌우보처상을 모시지 않았으며 영탑(影塔)을 세우지 아니한 것은 화엄(華嚴) 일승(一乘)의 깊은 종지(宗旨)를 나타낸 것이다.'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탑은 원융국사가 부석사에 주석하기 이전인 통일 신라 때 건립된 것으로 비록 무량수전 정면에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그 동쪽 언덕에 탑을 세운 것은 비문의 내용과는 상치되는 면이 있다.
탑은 높이 5.26m, 폭3.56m로 규모가 제법 있는 석탑이다. 이 석탑에 대해⟪부석사⟫(대원사 간행)라는 책에서는 부석사 동쪽 약 1.5㎞떨어진 절터에서 옮겨 왔다고 했으나 이 또한 잘못된 정보다.
보물 제249호 삼층 석탑과 석탑 앞 석등.
1910년대 자료 사진에서는 현재의 위치에 탑의 기단 일부가 벌어지고, 탑 전체가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을 1956년 9월 5일부터 10일까지 고 황수영 박사님의 감독 하에 보수공사를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부석사 경내의 성보문화재를 기록한 '부석사고물대장(浮石寺古物臺狀. 1938년 6월 10일 작성)' 필사본에 이 석탑 앞에 있는 석등을 일러 '선종표석(禪宗票石)'이라 하여 그 연번이 79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이 여래탑(如來塔)으로 연번 80번에 해당한다.
통일신라 때 석탑 앞에 석등이 있는 것은 정해진 법식인데 왜 이를 석등이라 하지 않고 '선종표석'이라고 했는지 의문이다. 고물대장이 작성된 해가 1938년(소화(昭和) 13)이니 사중에서는 그 이전부터 이 석등을 그렇게 불어왔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국보 제17호 석등은 연번 78번에 '석등(石燈)'으로 등재되어 있다.
현재 이 석등은 화사석과 상대석이 없어지고 옥개석과 중대석, 그리고 하대석과 지대석만 남아 마치 버섯과 같은 모양으로 남아 있다.
1930년대 작성된 기록에는 이 석등을 '선종표석(禪宗票石)'이라 불렀다.
그렇다면 왜 이 석등을 '선종표석'이라 명명했을까. 어쩌면 보물 제249호 삼층석탑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 일부 연구자에 의해 조심스럽지만 이 탑이 '의상 스님의 부도'가 아닐까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분명 원융국사 비문에는 '영탑(影塔)을 세우지 아니한 것은 화엄(華嚴) 일승(一乘)의 깊은 종지(宗旨)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음에도 이렇게 동쪽 한편에 삼층석탑을 세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석탑에서 100m가량 올라가면 의상 스님의 상을 모신 '조사당(祖師堂)'이 있다. 이와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는 유적들이 몇 군데 있다.
부석사에서 화엄을 공부하고 선문(禪門)에 들어간 동리산파의 개조(開祖) 적인선사 혜철(惠哲, 785~861) 스님의 태안사 부도, 희양산파의 개조인 지증대사 도헌(道憲, 824~882) 스님의 봉암사 부도, 사자산파의 징효대사 절중(折中, 826~900) 스님의 영월 법흥사 부도 등의 경내 위치를 고려한다면 보물 제249호 삼층석탑이 의상 스님의 '부도탑'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송고승전⟫에서도 말미에 '탑역존언(塔亦存焉)'이라 하여 스님의 부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앞서 언급한 9세기에 부석사에서 화엄을 수학했던 선문의 개산조(開山祖)들의 예를 상기해보면 적인선사는 삼나무로 관을 만들어 장사지냈으며, 지증대사도 임시로 유체를 모셨다가, 1년 뒤 장사를 지냈다. 또한 낭혜화상은 선실(禪室)에 2년간 모셨다가 부도를 만들었으며, 징효 대사는 다비하여 사리를 석분(石墳)에 안치하였다.
이들 선문 개산조들의 부도 위치를 살펴보면 적인선사는 태안사 대웅전 동북쪽 50m지점, 봉암사 지증대사탑은 금색전 북북동 30m지점, 법흥사 징효대사탑은 현 대웅전 북동 30m지점, 성주사지 낭혜화상 탑비는 금당지 서북쪽 50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밖에 가지산문(迦智山門) 보림사(寶林寺) 체징(體澄, 804~890) 스님의 부도는 현 대적광전 동쪽 100여m 지점, 실상산문(實相山門)의 홍척(洪陟) 선사의 실상사(實相寺) 탑비는 보광전 서남쪽 100여m지점 등이다.
이와 함께 신라의 불교 공인 이후 ⟪삼국유사⟫에 실린 승려들의 장례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사례에서 매장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자장(慈藏) 스님의 경우 화장을 한 뒤 유골을 석실(石室)에 안치하였고, 혜현(惠現) 스님의 경우 시신을 석실에 안치하여 호랑이가 다 먹어버리고 남은 해골과 혀만 석탑에 간직하였다고 한다.
기록에 나타나는 통일신라 시대의 승려 장례법으로 매장과 이차장(二次葬)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상 스님도 입적 후 유골을 따로 모아 탑 등에 봉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부석사에서 출가한 후 선문에 들어간 적인선사 등의 부도 봉안 사례 등을 종합해 보면 지금 무량수전 동쪽의 삼층석탑이 어떤 성격으로 그곳에 세워졌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일말의 단서가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무엇도 장담하거나 결론짓지는 못한다. 다만 1938년 작성된 '고물대장'에서 삼층석탑 앞의 석등을 '선종표석'이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전히 화두로 남는다.
자발적 유료 독자에 동참해 주십시오.